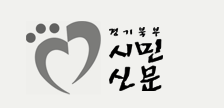(1)%5B1%5D%5B1%5D(1)(1)(1).jpg) 임진왜란은 일본의 지배자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허황된 정복욕과 센고쿠 시대의 혼란을 침략으로 극복하려는 일본 내부 문제가 혼재된 동아시아의 비극이다. 전쟁터가 된 조선과 침략자 일본, 병력 지원에 나선 명나라 등 삼국은 막대한 인명과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
임진왜란은 일본의 지배자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허황된 정복욕과 센고쿠 시대의 혼란을 침략으로 극복하려는 일본 내부 문제가 혼재된 동아시아의 비극이다. 전쟁터가 된 조선과 침략자 일본, 병력 지원에 나선 명나라 등 삼국은 막대한 인명과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전쟁으로 조선, 일본, 명나라 사람들의 새로운 교류의 장이 펼쳐졌다. 먼저 개전 초기 조선에 투항한 항왜의 대명사 사야가는 조선에 조총과 새로운 화약 제조 및 사격 기술을 전하는 데 큰 공을 세웠다.
특히 사야가는 김충선이라는 조선식 이름과 높은 벼슬을 하사받아 후일 여진의 침략에도 맞서 싸우는 조선의 명장이 됐다. 또한 사야가를 비롯한 1만명에 달하는 항왜는 조선 군사력 발전과 일본 문화 전파의 구심점이 됐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수많은 조선인 납치에 따른 성리학과 도자기 기술로 일본은 문화 부흥의 기회를 가졌다. 이삼평은 조선 도공 출신이다. 그는 일본에 정착해 아리타 자기의 원조로서 유럽까지 큰 명성을 얻었다.
조선을 구한 이순신 장군과 함께 남해 바다를 누볐던 명 수군 제독 진린도 전란이 종료되자 고향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명이 멸망하자 진린의 손자 진영소는 조부의 발자취가 남은 조선 남해로 향했다. 그가 뿌리 내린 곳은 전남 강진을 거쳐 해남이었다. 한중 우호의 상징이 된 광동 진씨의 역사는 진린 제독이 시작이다.
이처럼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이면에는 한중일 삼국 사람들의 교류가 존재했다. 자기 고향을 떠나 타국에 정착한 사야가, 이삼평, 진평소는 새로운 삶을 개척했고, 현지인들과 잘 융합해 삶을 이어갔다.
최근 한일 관계가 험악해졌다. 국교 정상화 이후 최악의 상태라는 진단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이유야 어찌됐든 양국 정치인들의 이기적인 DNA가 빚어낸 외교 참사다. “세상은 바꿀 수 있어도 이웃은 바꿀 수 없다”는 속담이 한일 양국의 숙명적인 관계를 설명해준다. 정치인의 싸움은 그들에게 맡기고 민간교류는 이어져야 한다.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