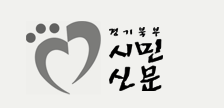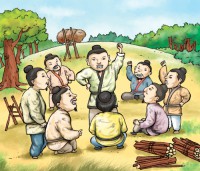 사람은 죽으면 모두 한 줌 재로 돌아간다. 그러나 오래되지 않은 옛날에는 대부분 땅에 묻혀 자연으로 돌아갔다. 그 때는 고인의 시신을 어디에 묻느냐 하는 일이 중요했다. 위치에 따라 살아있는 후손,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후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른바 명당을 찾는 일이었다.
사람은 죽으면 모두 한 줌 재로 돌아간다. 그러나 오래되지 않은 옛날에는 대부분 땅에 묻혀 자연으로 돌아갔다. 그 때는 고인의 시신을 어디에 묻느냐 하는 일이 중요했다. 위치에 따라 살아있는 후손,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후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른바 명당을 찾는 일이었다.
명당에 관한 이야기는 양주지역에서도 전해진다. 백씨 집안과 홍씨 집안에 얽힌 기막힌 이야기는 2012년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구비문학대계> 제작에 은현면 봉암리 주민 남선휘씨가 제보했다. 옛날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덤자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지 알 수 있는 좋은 사례이다.
남면 매곡리 주변에 수원 백씨가 많이 사는데, 갓바위 망당산(望唐山) 기자(基字)에 16대조라고 전해지는 수원 백씨의 시조를 모신 산소도 있다. 인근에는 백씨뿐만 아니라 남양 홍씨도 많이 사는데, 홍씨 처녀가 백씨 집안으로 시집을 갔다.
아들 하나를 낳고 잘 사는가 싶더니, 남편이 덜컥 죽어버렸다. 사정은 점점 어려워져 아들을 키우기도 힘들었다. 할 수 없이 잘 사는 친정으로 와서 살게 되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친정아버지가 죽고 말았다.
오일장을 치르던 밤중에 사람들이 잠든 사이 딸은 집 바깥에 있는 변소에 갔다. 딸이 조용히 변소에 앉아 있는데, 길 가던 스님들의 이야기가 들려왔다.
“큰스님, 저 묫자리가 아주 명당입니다.” “밤말은 쥐가 듣고 낮말을 새가 듣는단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딸이 가만히 생각하니 친정아버지 묫자리에 대한 이야기였다. 남편이 죽고 아들과 친정살이를 하는데, 아이도 몸이 약해서 항상 걱정이었다. 그러니 그 묫자리가 욕심이 났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딸은 곧바로 물동이에 물을 담아 올라갔다. 이미 광중을 다 파놓았기 때문에 딸은 몇 번씩 물을 이고 와서 부었다. 이런 일을 전혀 모르는 상주가 일어나서 산소 자리로 갔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다. 어제까지 말짱하던 곳에 물이 가득 차 있는 것이었다. 상주인 아들이 장사를 못 지내겠다고 하자 지관이 와서 말했다.
“이건 절대로 이럴 수 없다. 물이 날 자리가 아니다. 해가 나오면 말려서 장사를 지내라.” 하지만 상주는 그보다 한 단 아래에 있는 땅에 산소를 마련했다. 시간이 흘러 삼년상이 다 지나고 나자 딸이 자기 오빠에게 부탁을 했다.
“오라버니. 죽은 남편의 산소를 아무데나 썼는데, 아버지 모시려던 자리, 물이 나서 못 쓰게 된 자리를 내가 쓰면 안 되겠습니까? 가까이 남편을 두고 있으면 마음의 큰 짐을 덜 것 같으니 오라버니가 승낙해주십시오.”
오빠는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동생이 측은하고, 또 어차피 버린 자리라고 생각하여 승낙을 했다. 딸은 얼른 남편의 묘를 옮겼다. 그 자리가 백씨네 제일 윗 산소로 옥녀가 머리를 빗는 형국이라고 한다. 그 이후 아들이 공부도 잘하고 나중에 아주 크게 성공했고, 자손들도 대대로 잘 되어 남면에 수원 백씨가 많이 퍼졌다고 한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백씨 집안이 시월이면 산소를 찾아와 제일 윗대에서부터 시향(時享)을 내려 지내는데, 같은 날에 홍씨 집안도 시향을 지내러 왔다. 그런데 번번이 백씨 집안이 먼저 와서 지내고, “우리 제사 지냈으니 외할아버지 제사를 같이 지내야 한다”고 하면서 절만 하고 음식을 모두 먹어치우는 것이었다.
홍씨 집안은 백씨 집안의 그런 모습이 너무 밉고 보기 싫었다. 그래서 홍씨 집안이 시향 날짜를 옮겨버렸다고 한다. 이 이야기를 두고 산소자리에 음덕(蔭德)이 있다고 하고, 한편으로는 딸은 도둑이라는 말도 생겼다.
이와 거의 비슷한 이야기가 은현면 도하리 황골에도 전해지는데, 주민 김분자씨가 제보한 이야기에 따르면 딸이 친정아버지 명당자리에 시아버지 시신을 묻은 후 시댁 집안은 크게 일어났고 친정 집안은 기울었다고 한다.
정말 명당이 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최근까지도 명당을 찾는 대기업 집안의 이야기가 떠돌아 딱히 믿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차마 무시할 수는 없는 일로 여길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