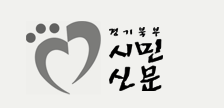신화는 신성한 이야기다. 정확하게 말하면 신성하게 여기는 이야기다. 이 세상이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만물과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의문에 답하고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다.
고전이란, 많이 알고 있으나 정작 읽지는 않는 책이라고 정의한다. 우리 신화는 많이 알고 있지도 않으니 이보다 더하다. 그러면서도 서양 신화에 대해서는 잘도 안다. 그간 몇몇 책이 나와 우리 신화를 소개하고 이해하게 해주었지만 아쉬움이 있었다. 작가들이 낸 책은 쉽지만 원전에서 멀어지기 일쑤이고, 전문가의 책은 어려운 것은 물론 자료의 일부만 다루었거나 해석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책이 <원문대조 한국신화>(민속원,
www.minsokwon.com)다.
사제지간인 이복규 서경대학교 교수와 양정화 작가가 오랜 준비기간을 거쳐 엮은 책으로, 우리 구전 신화의 여러 유형을 망라하고 있다. 신화의 전문(全文)을 원전대로 싣고, 일반인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현대문으로 바꾸어 나란히 놓았다. 원문을 그대로 실어줌으로써 전문가에게 도움이 되고, 현대문을 함께 실음으로써 일반인도 친근하게 읽게 했다.
우리 신화는 서양 신화와도 다르고 중국이나 일본 신화와도 다르다. 같은 점도 있지만 엄연히 다르다. 예컨대 서양 신화는 신들의 이야기지만, 우리 신화는 신이 된 인간의 이야기가 더 많다. 서양 신화에는 창조신화가 있지만 우리 신화는 개벽신화라 하여 창조 이후의 단계를 보여준다. 서양 신화가 비극적인 결말인 데 비해 우리 신화는 행복한 결말을 선호하는 것도 다르다.
한국문화의 원형을 알게 하고 이를 콘텐츠화하는 데 우리 구전 신화만큼 적실한 자료가 없으며, <원문대조 한국신화>는 그 전모를 읽을 수 있는 책이다. 해석보다도 우리 신화 자체를 풍부하게 읽을 수 있도록 소개하고 있어 의미가 더욱 크다. 그리고 지금까지 채록되어 있는 신화와 설화 전반에서 신화소(神話素)를 지닌 이야기를 추가하여 사라지거나 파편화된 우리 신화를 추적하고 되살리는 데도 큰 도움이 되리라 본다.
구비 전승되어온 신화를 주제에 따라 ‘세상을 건 내기’, ‘모험을 떠난 여신들’, ‘신에 맞선 인간’, ‘가족과 집, 갈등 그리고 화합’, ‘신들의 사랑’, ‘신들이 지켜주는 것들’, ‘그 밖의 다른 신들의 이야기’ 등 7장으로 나누어 싣고, 원전은 의미를 그대로 살렸다. 현대문에서는 무속 용어와 제주도 방언의 난해성 문제를 해결하여 일반인들도 쉽게 읽을 수 있다.
두 편자는 “이 책은 우리 신화가 우리 민중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으며, 특히 우리 신화에 관심을 가질 독자들과 우리 문화 특유의 콘텐츠를 찾는 사람들에게 풍부한 이야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며 “이 책을 토대로 우리 신화를 더욱 대중화 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많은 작가들이 찾아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