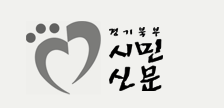우리는 국가에 막대한 해를 끼치는 인물들을 향해 ‘신(新)을사오적’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곤 한다. 매국 행위자의 대명사가 된 을사오적은 과연 어떤 인물들이었을까? 우리는 대부분 을사오적 중 이완용만 기억하는 특이한 기억력을 갖고 있다. 앞으로 5회에 걸쳐 을사오적에 대해 다루려 한다.
오늘의 역적은 박제순이다. 박제순은 1858년 경기도 용인에서 태어났다. 그는 1883년(고종 20) 별시 병과로 합격해 주요 관직을 거쳤다.
박제순은 특히 동학농민혁명과 악연이 있다. 1893년 호조참판 재직 시, 동학교도가 보은집회를 열자 위안스카이와 청나라 군사 파병문제를 협의한 적도 있고, 충청도 관찰사로 충남 공주에서 일어난 동학농민군을 진압한 적도 있다. 한 마디로 외세 개입과 동족 학살에 앞장 선 인물로 볼 수 있다.
박제순이 역사의 기록에 남게 된 것은 을사조약 조인에 앞장섰기 때문이다. 일본은 1905년 11월17일 이완용, 이근택, 권중현, 이지용, 박제순 등 을사오적을 앞잡이 삼아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보호국으로 만드는 을사조약을 강제로 체결했다. 그는 을사조약 체결 후, 고위 관직을 고루 거쳐 1909년 12월 청나라도 세계적인 역적으로 인정한 이완용이 명동성당 앞에서 이재명 의사의 거사로 중상을 입자 임시 내각총리대신에 오르기도 했다.
그의 매국행위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한일병합조약 당시 내무대신 자격으로 조약에 서명했다. 일제로서는 참으로 기특한 인사가 아닐 수 없다. 1910년 한일병합조약이 체결돼 대한제국이 일제의 식민지가 되자 그해 일본 정부로부터 자작의 작위를 받았고, 중추원의 고문이 되어 일제로부터 거액의 수당도 챙겼다. 박제순은 1916년 사망할 때까지 일제 앞잡이로 부귀영화를 누렸다. 현재 박제순은 대표적인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탄을 받고 있다.
정치인이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것은 충신 아니면 역적일 때이다. 충신과 역적의 갈림길은 국민을 대하는 태도에서 시작한다. 졸(卒)로 보느냐? 섬김의 대상으로 보느냐 그 차이일 뿐이다.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