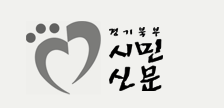(1)(1)(1)(1)(1)(1)(1)(1)(1)(1).jpg) 코넬대학교 빅토리아 메드벡(Victoria Medvec) 교수와 토머스 길로비치(Thomas Gilovich) 교수는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 관한 유명한 연구에서 약 30명의 은메달리스트와 동메달리스트의 영상을 수집했다.
코넬대학교 빅토리아 메드벡(Victoria Medvec) 교수와 토머스 길로비치(Thomas Gilovich) 교수는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 관한 유명한 연구에서 약 30명의 은메달리스트와 동메달리스트의 영상을 수집했다.
그리고 스포츠에 대해 잘 모르고 경기에 관심 없는 일반인들에게 영상을 보여주며 선수들을 관찰하게 하였다. 최종 결과를 숨긴 채 경기가 끝난 직후의 모습과 시상식에 등장한 선수들의 모습을 보게 한 것이다. 그런 다음 참가자들의 얼굴을 10단계로 나누어 괴로움에서 황홀감까지 평가하도록 했다.
즉 은메달리스트와 동메달리스트의 행복도를 일반 평가자들에게 평가하도록 한 것이다. 그 결과는 동메달리스트들이 은메달리스트들보다 훨씬 더 행복한 결과를 나타냈다. 동메달리스트들의 행복표정 점수는 7.1점이었고 은메달리스트들의 행복표정 점수는 4.8점으로 나타난 것이다.
샌프란시스코 주립대학교의 데이비드 마쓰모토(David Matsumoto) 교수는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남여 유도 경기에서 2만1,000장의 사진을 수집했다. 35개국에서 온 84명의 모습을 촬영한 방대한 사진 모음이었다. 출신 국가나 민족에 상관 없이 메달리스트들의 표정은 놀라울 정도로 차이가 났다.
시상식이 진행되는 동안 금메달리스트들은 거의 모두가 활짝 웃고 있었다. 금메달리스트 다음으로 많이 웃는 메달리스트는? 은메달리스트가 아니라 동메달리스트였다. 금메달리스트에 비해 동메달리스트는 2분의 1 정도 웃었고 은메달리스트는 금메달리스트의 4분의 1만 미소짓고 있었다.
2020년 미네소타 대학교의 윌리엄 헤지콕(William Hedgcock) 교수와 아이오와 대학교의 안드레아 루앙그라스(Andrea Luangrath) 교수는 67개국 142개 종목에서 다섯번 올림픽 경기에 출전한 선수 413명의 사진을 수집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수들의 얼굴을 평가해달라고 요청하는 대신 얼굴 표정을 자동으로 평가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인 이모션트(Emotient)를 사용했다. 그 결과 금메달리스트들이 가장 많이 웃고 있었다. 다음은 동메달리스트들이 많이 웃고 있었고 은메달리스트들은 동메달리스트들에 비해 훨씬 덜 웃고 있었다.
연구자들은 “객관적으로 더 좋은 결과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은메달리스트들은 기분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왜 은메달리스트들은 동메달리스트들에 비해 더 불행한 마음을 가질까? 연구자들은 이런 마음을 반사실적 사고(Counterfactuals) 때문이라고 결론지었다.
반사실적 사고는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난다. 즉 아래로 향하는 하향식 반사실적 사고(downward counterfactuals)와 위로 향하는 상향식 반사실적 사고(upward counterfactuals)로 나타나는 것이다.
하향식 반사실적 사고는 더 나빠질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적어도’ 이 정도는 되었으니 다행으로 생각하고 마음에 안정을 되찾는 모습이다. 상향식 반사실적 사고는 조금만 더 노력을 ‘했더라면’ 더 좋은 결과를 얻었을 텐데라고 생각하며 아쉬운 마음을 갖는 것이다.
즉 대회가 끝난 후 메달리스트들의 인터뷰를 검토하면서 동메달리스트들은 ‘적어도’를 흥얼거리며 행복한 표정을 지었음을 알아냈다. “적어도 4위는 안했어요. 적어도 메달은 땄어요.” 반면 은메달리스트들은 ‘했더라면’으로 아쉬워하고 마음에 상처를 받는다고 했다.
“보폭을 조금만 늘리기만 했어도. 호흡을 조금만 더 조절했더라면. 발가락을 곧추세우기만 했더라면. 마지막에 조금만 더 정신차렸다면 어찌됐을까?” 상상하면서 머리가 복잡해져서 은메달리스트로서 느낄 수 있는 기쁨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리고 찬란한 금메달에 주어지는 모든 사회적, 재정적 보상에서 한걸음 뒤처졌다는 아쉬움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는다는 것이다. 즉 2위와 3위의 차이는 ‘했더라면’과 ‘적어도’의 마음상태인 것이다. ‘적어도’의 위안과 ‘했더라면’의 후회가 동메달리스트의 행복도가 은메달리스트의 행복도보다 훨씬 높은 심리상태로 나타난 것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항상 여러 가지 상황에 맞닥뜨리며 살고 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두 가지 해석과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즉 ‘적어도’와 ‘했더라면’의 기로에 서는 것이다.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했더라면’의 순간이 ‘적어도’보다 많다는 것이다. 즉 반사실적 서술의 80%는 ‘했더라면’이라는 상향적 반사실적 서술이고, 20%는 ‘적어도’의 하향적 반사실적 서술이라는 것이다. 이는 일반적인 결과이고 이와 반대의 경우가 있다.
쓰나미나 큰 자연재해를 겪은 이들은 ‘적어도’의 경우를 ‘했더라면’의 서술보다 열 배 더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재해 속에서도 살아남은 것을 행운으로 여겼고 동메달리스트들의 경험처럼 ‘적어도’를 더 많이 떠올린 것이다. 그래서 자연재해를 당했으면서도 슬퍼하지 않고 살아남은 것을 다행으로 여기는 것이다.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하든지 ‘했더라면’보다 ‘적어도’를 많이 떠올릴수록 행복하다. 물론 지금 당장 행복의 측면에서는 ‘적어도’를 떠올리는 것이 좋지만 미래에 더 나은 결정을 내리거나 더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했더라면’이 더 좋을 수도 있다.
‘했더라면’은 당장 우리의 감정을 악화시키지만 이후 우리의 삶을 개선시켜주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다. ‘적어도’와 ‘했더라면’을 적절히 잘 응용해서 지금의 행복과 앞으로의 좋은 성과를 위한 개선의 계기를 만들 필요가 있다.
매일 웃으면 이 두 가지를 적절히 잘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도 웃자. 하하하하하~
하하웃음행복센터 원장, 의정부제일간호학원 원장, 웃음치료 전문가(1급), <웃음에 희망을 걸다>, <웃음희망 행복나눔>, <15초 웃음의 기적>, <웃음은 인생을 춤추게 한다>, <일단 웃자>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