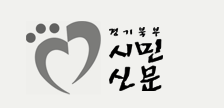.png)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가 제조업 및 건설현장에 방문하여 안전관리 기술 지도를 할 때 가장 어려운 시기가 지난해 경험에 비추어 아마 여름철이 아닌가 싶다. 근로자들은 지쳐 있고 현장은 장마철 대비 바쁘게 돌아가는데, 날씨는 덥고 습하여 일의 집중도가 떨어지면 추락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계절이다.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가 제조업 및 건설현장에 방문하여 안전관리 기술 지도를 할 때 가장 어려운 시기가 지난해 경험에 비추어 아마 여름철이 아닌가 싶다. 근로자들은 지쳐 있고 현장은 장마철 대비 바쁘게 돌아가는데, 날씨는 덥고 습하여 일의 집중도가 떨어지면 추락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계절이다.
이젠 제조업체나 건설현장에서는 수시로 위험성 평가를 생활화해야 하는데 현장을 다녀보는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로서는 위험성 평가는 갈 길이 아직 멀어 이해를 돕고자 한다.
정부에서는 사망사고와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으로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 개정안(23.05.22 시행)을 내려 사망, 부상, 질병의 가능성 있는 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지만 산업현장은 아직도 준비가 미흡하다. 이젠 사업주,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근로자 모두 변해야 한다.
올해는 300인 이상, 24년은 50~299인, 25년부터는 50인 미만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함으로서 중소제조업체는 이제부터라도 준비하여 산업안전 패러다임이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전환되는 시대 흐름에 따라 위험성 평가가 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재해를 사전 예방해야 할 것이다.
어렵게 느껴지는 위험성 평가를 정부에서는 쉽게 재정립하여 정의하였다.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여 개선대책 마련에 집중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평가 시기도 업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년 실시해야 하는 정기평가제도 없이 최초 평가는 사업장 성립일 이후 1개월 이내 착수로 명확하게 정하고 정기평가는 최초, 수시평가 결과 결정한 위험 수준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는 수준으로 부담을 낮추며, 유해·위험요인 변동이 잦은 사업장을 위한 상시평가제도를 신설하였다.
상시평가는 월, 주, 일 단위의 주기적 위험성 평가 및 결과를 교육하고 공유하는 경우 수시 및 정기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위험성 평가를 하는 모든 과정을 근로자가 참여하여 함께하고 그 결과를 모든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유해·위험요인을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를 통해 상시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알려 공유하는 게 중요하다. 이 밖에도 2차 사고를 일으킨 유해·위험요인은 위험성 평가를 꼭 실시하여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미리 차단하여 재해를 예방하자는 내용이다.
그럼 위험성 평가는 왜 하는 것일까? 핵심 포인트는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사업장에서 위험요인을 찾는 것이다. ‘위험 요소를 찾으면 안전대책이 보입니다’는 말과 같이 일반적으로 위험한 상태나 상황이 보이면 자연스럽게 그 해결 방안을 찾게 된다. 그런 위험요인은 근로자나 현장 관리감독자가 가장 잘 알고 있으나, 어제도 괜찮았고 오늘도 괜찮으니 내일도 괜찮을 것이라고 믿고 안일하게 넘어간다. 작업에 참여하는 근로자와 관리감독자는 그 작업의 위험성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감소 방법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현장 근로자의 솔직하고 정직한 마음의 참여가 중요하다.
어렵게 느껴지는 위험성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방법이 있지만, 자체에서 노력해보자. 우선 사업장 관리감독자 중 1명 또는 그 이상이 매년 실시하는 관리감독자 교육(16시간) 대신 위험성 평가 교육을 받으면 관리감독자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해 준다. 교육이 필요하고 사전 교육이 되면 한국산업안전공단 홈페이지를 활용하면 된다. 산업안전공단에서는 직종별 사업체의 위험성 평가를 돕는 자료들이 많다.
그중 홈페이지 중간 위험성 평가 지원시스템에 가입하고 위험성 평가지원 자료실에서 위험성 평가 관련 자료를 검색하면 위험성 평가 실시 규정 표준 문서와 위험성 평가표 서식, 활용 문서 서식이 있어 내려받아 우리 실정에 맞게 활용하면 된다. 여러분의 관심과 노력만이 현장에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
.png)
.png)
.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