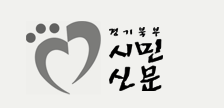(1)(1).jpg) 벼룩은 높이뛰기 선수다. 키는 0.2~0.4㎝ 정도 되는데 제자리에서 30㎝ 이상을 뛰어오를 수 있다고 한다. 자신의 키보다 무려 80~150배나 높이 뛰어오를 수 있는 점프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벼룩을 대상으로 재미있는 실험결과가 있다. ‘벼룩의 여왕’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루이저 오스 차일드 박사의 실험이 그것이다.
벼룩은 높이뛰기 선수다. 키는 0.2~0.4㎝ 정도 되는데 제자리에서 30㎝ 이상을 뛰어오를 수 있다고 한다. 자신의 키보다 무려 80~150배나 높이 뛰어오를 수 있는 점프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벼룩을 대상으로 재미있는 실험결과가 있다. ‘벼룩의 여왕’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루이저 오스 차일드 박사의 실험이 그것이다.
그는 한 무리의 벼룩을 대형용기에 넣고 투명한 뚜껑의 유리를 덮었다. 그러자 벼룩이 튀어 올라 유리 뚜껑에 부딪치는 탁탁거리는 소리가 한동안 이어졌다. 얼마 동안 그대로 두자 소리가 잦아들었다. 그리고 나서 유리 덮개를 열었다. 벼룩들은 여전히 뛰고 있었지만 놀랍게도 뛰는 높이는 유리 덮개가 있던 정도보다 약간 낮은 위치까지만 뛰고 있는 것이다. 높이 뛰어 용기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데도 벼룩들은 유리 덮개에 머리를 부딪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했는지 딱 덮개가 있던 높이까지만 뛰어올랐던 것이다.
정해진 삶에 금세 익숙해진 벼룩은 그 환경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삶의 환경에 지배받고 있었던 것이다. 스스로 한계를 정해 더 높이 뛰어오르지 못하는 것이다. 움직이고자 하는 욕망과 잠재력이 자기 자신에 의해 말살되는 이런 현상을 과학자들은 ‘자기불구화(Self handicapping)’라고 정의했다. 이런 자기불구화는 우리 인간세계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나는 사교적이지 못해.” “나는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이야.” “나는 게을러.” “나는 공부를 못해.” “나는 기억력이 나빠.” “나는 너무 실수가 많아.” “나는 너무 가난해.” “나는 너무 긴장을 잘해.” “나는 원래 천성이 이래.” 사람들은 이처럼 부정적이고 진취적이지 못한 꼬리표를 붙이고 자기 자신을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자기불구화는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억눌러 스스로를 지극히 형편없는 사람으로 전락시킨다.
미국 하버드 음대에 아주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새 지도교수로 부임하였다. 피아니스트가 꿈이었던 한 학생이 수업 후 항상 교수를 찾아가 지도를 청했고 3개월 동안 개별 레슨을 받기로 했다. 레슨이 있던 첫날 교수는 학생에게 악보 하나를 건네며 말했다. “난이도가 좀 있는 악보인데 일단 쳐보게.” 어려운 곡이라 학생은 계속 버벅거리며 억지로 연주를 마쳤다. “확실히 아직 숙련이 안 됐군. 일주일의 시간을 줄테니 가서 잘 연습해와. 일주일 후에 다시 보자고.”
학생은 교수의 칭찬을 듣고 싶어 간절한 마음으로 열심히 연습했다. 일주일 후 학생은 자신만만하게 교수를 찾아갔다. 그런데 교수는 지난 레슨 과제에 대해서는 들어볼 생각도 않고 보자마자 새로운 악보를 건네는 것 아닌가? “이 곡을 연습해오게. 2주간의 시간을 주지.” 악보를 살펴본 학생은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지난번 악보보다 훨씬 어려운 곡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학생은 그 과제를 수행하려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더 열심히 연습하기 시작했다.
2주 후 어느 정도 곡을 익힌 학생은 교수를 찾아갔다. 그런데 피아노실에 도착했을 때 교수는 없었다. 그저 다른 악보 하나가 놓여있을 뿐이었다. 악보를 살펴본 학생은 정신이 혼미해졌다. “망했다. 이 악보는 읽지도 못하겠어. 너무 어려워.” 학생은 스스로 독백하며 자신감이 바닥으로 굴러떨어지는 듯 했다. 그는 교수가 왜 이런 방법으로 자신을 골탕 먹이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는 한참이나 기다렸고 교수가 들어오자 참지 못하고 항의하기 시작했다. 교수는 한참 동안 학생을 바라보다가 드디어 입을 열어 한마디 했다.
“연주를 시작해.” 화가 난 학생은 씩씩거리며 악보를 펼치고는 이를 악물고 미친 듯 연주를 시작했다. 그런데 그 순간 학생 스스로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했던 곡을 자신이 아주 아름답고 섬세하게 연주할 수 있었던 것이다. 연주를 마친 학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때 교수가 이야기하였다. “만약 내가 자네의 바람대로 간단한 곡만 연주하게 했다면 자네는 이런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을 거야.” 학생은 습관적으로 자신을 낮게 평가하며 도전해 보기 전에 스스로 선을 긋는 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다.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신의 한계를 초월하는 수많은 도전과 끝없이 어려워지는 요구들을 수행하면서 알게 모르게 자신의 능력이 키워졌음을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은 우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다. “과연 이 일을 내가 해낼 수 있을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 놓은 틀부터 깨부셔야 한다. 자신이 만든 틀을 깨고 자신이 그어놓은 선을 용감히 뛰어넘고 자신이 붙여 놓은 꼬리표를 과감히 떼어 버리고 자신의 잠재력을 깨워 도전하라.
우리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고 용기 있게 도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잠재력에 대해 에디슨은 이런 말을 했다. “사람이 감추고 있는 잠재력은 무궁무진합니다. 자신을 믿으십시오. 극복하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난 못해, 안 돼, 방법이 없어, 안 통해, 절망적이야라고 말하며 뒷걸음치지 마십시오.” 우리의 숨은 잠재력을 일깨우고 실현하는데 웃음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웃음은 새로운 용기를 일깨워 준다. 웃음은 희망과 감사의 또 다른 표현인 것이다.
하하웃음행복센터 원장, 의정부제일간호학원 원장, 웃음치료 전문가(1급), <웃음에 희망을 걸다>, <웃음희망 행복나눔>, <15초 웃음의 기적>, <웃음은 인생을 춤추게 한다>, <일단 웃자>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