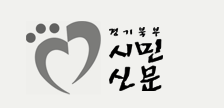(1)(1)(1)(1)(1).jpg) 2014년 한 해 동안 연예인, 정치인, 스포츠 스타들을 필두로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지정해가며 얼음물을 바가지로 뒤집어썼다. 이것은 근위축성측색경화증이라는 이른바 루게릭병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이 질병을 퇴치하려는 모금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행사였다.
2014년 한 해 동안 연예인, 정치인, 스포츠 스타들을 필두로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지정해가며 얼음물을 바가지로 뒤집어썼다. 이것은 근위축성측색경화증이라는 이른바 루게릭병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이 질병을 퇴치하려는 모금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행사였다.
이 방식은 한 사람이 머리에 얼음물을 뒤집어쓰는 모습을 촬영하고 다음 사람을 공식적으로 지명하여 공유하는 형식으로 이어져간다. 2014년 여름에 시작된 이 운동은 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고 유명 운동선수와 CEO, 굵직한 정치인들과 연예인들이 대부분 동참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국가적 가뭄 상태를 고려해 기부만 하고 물을 들이붓지는 않은 것으로 기억된다.
이 아이스버킷 챌린지는 선한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재미까지 더해 가히 인기는 폭발적이었다. 하지만 여기엔 불편한 진실이 있다. 루게릭병 퇴치에 공헌했다거나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병을 호전시켰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일반인들에게 생소한 루게릭병이 어떤 병인지 널리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었지만 딱 거기까지만 효과가 있었지 정작 환자들에게 큰 도움은 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아이스버킷 챌린지를 통해 모금된 액수는 약 1억 달러(한화 1,030억원)로 그 중 27% 미만의 금액만 루게릭 연구기금으로 쓰이고 나머지 73% 이상은 홍보비, 행사비, 출장비 명목으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기부금 상당수가 재단 중역의 급여로 사용된 것이다. 비영리 재단의 투명성을 감시하는 국제기관 ECFA에 의하면 원래 의도한 프로젝트의 최소 80%가 기부되어야 신뢰할만한 기부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모자라도 한참 모자란 기부 행위였던 것이다.
우리나라도 핑크리본을 앞세운 유방암 예방 및 주의 환기 운동이 많이 보편화되어 있지만 미국의 경우 매년 10월이면 핑크색으로 물든다. 핑크리본을 앞세운 ‘유방암 인식의 달’이기 때문이다. 유방암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질병 퇴치를 위한 각종 모금 행사가 전국적으로 펼쳐진다. 여성을 위협하는 질병인 유방암을 퇴치하자는 인류애 넘치는 선한 목적에 유명 연예인, 정치인, 스포츠 스타들도 참여한다. 거구의 미식축구 선수들도 귀여운 핑크리본 장식과 핑크색 양말을 신고 이 행사에 참여한다. 1991년 시작된 이래 이제는 아주 빼놓을 수 없는 국가의 큰 문화행사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이곳에도 불편한 진실은 있다. 이 행사를 주최하는 수잔 코멘 재단(Susan G Komen Foundation)은 유방암 퇴치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단체다. 기부금이나 모금액 중 유방암 연구 지원금이나 유방암 환자를 지원하는 금액은 매우 미미하다. 이 단체의 중요 수입원은 암 증가 원인으로 지목받는 가공식품 업체들과 연결해 홍보하는 일이다. 탄산음료, 시리얼, 통조림, 샴푸, 화장품 등에 핑크리본이 찍혀 나오고 심지어는 KFC의 핑크리본 치킨도 있다.
퀸스 대학의 사만다 킹(Samantha King) 교수는 이렇게 개탄했다. “두려운 질병이자 개인의 비극이었던 유방암이 기업 주도의 마케팅 도구로 전락했다.” 물론 핑크리본 운동이 일반인들에게 유방암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긍정적인 요소로 영향을 미쳤지만 거기까지였던 것이다.
미국의 암 학회 정관에는 암이 퇴치되면 미국 암 학회를 해산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과연 이런 날이 올 수 있을까? 과연 암 학회는 암이 진정으로 퇴치되기를 바랄까? 모두들 아니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암 학회는 지금 이대로가 사업하기에 더 좋은 것만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많은 이들이 미국 암 학회는 암 퇴치에 전력을 다하는 단체라고 믿고 있을 것이다. 과연 그럴까? 여기에도 매우 불편한 진실은 존재한다.
미국의 암 학회가 환자들을 위한 단체가 아니라는 것은 그 재정적인 지원이 어디서 오는가를 보면 자명해진다. 미국 암 학회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부유한 비영리 단체 중 하나이다. 토지나 건물, 차량 등을 비롯한 총 자산이 23억 달러(약 2조 8,000억원)에 달한다. 이러한 방대한 규모의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대기업들과 아주 밀접한 유착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 당연히 가공식품의 유해성에 대한 경고는 엄두도 낼 수 없고 한 때는 담배의 유해성을 이야기할 수 없었을뿐더러 오히려 담배가 몸에 좋다는 의견을 내놓는 흑역사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2008년 미국 암 학회 예산은 10억 4,000만 달러(약 1조 2,000억원)였는데 이 중 연구지원비는 고작 10% 미만이었다. 직원들의 급여 약 4억 900만 달러가 지출되었고 그 중 암 학회 회장의 연봉이 104만 달러(약 11억 8,000만원)이며 여기에 활동지원비가 추가되었다. 기부금 받은 것이 거의 전부 마케팅 사업과 급여에 사용되었다. 개인의 선한 뜻에 기초해서 모금한 기부금과 기업이 착한 사업을 위해 동조하는 기부금의 사용처를 보면 사기요 갈취에 가깝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해서 모금한 기부금을 대표가 사적으로 이용한 정의기억연대 사건이 생각난다. 정치권을 시민의 눈이 감시하듯 비영리 기부단체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이런 의심들 때문에 한국의 기부문화가 바닥으로 가라앉는 일이 없기를 바랄 뿐이다. 선하고 양심적인 기부문화 속에 불편한 진실은 말끔히 사라졌으면 좋겠다. 오늘도 넉넉한 마음으로 웃으면서 포용하는 하루가 되기를.
하하웃음행복센터 원장, 의정부제일간호학원 원장, 웃음치료 전문가(1급), <웃음에 희망을 걸다>, <웃음희망 행복나눔>, <15초 웃음의 기적>, <웃음은 인생을 춤추게 한다>, <일단 웃자>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