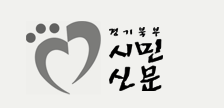.jpg)
.jpg) “고아보다는 어른이 되기로 했어.”
“고아보다는 어른이 되기로 했어.”
김형경 소설 ‘꽃피는 고래’(창비, 2008)에서 17세 소녀 니은이 친구인 나무에게 하는 말이다. 니은의 부모는 자동차 사고로 갑자기 세상에서 사라졌다. 니은은 밑 모를 슬픔과 수십겹 상실감을 어찌할 수가 없다. 갑작스런 상실은 망연자실을 불러온다.
니은은 학교를 그만두고 부모님의 고향인 처용포(울산 장생포로 추정됨)에 내려와 여러 사람들을 만난다. 어릴 때 입양한 아이가 커서 출생의 비밀을 알고 휘두르는 악다구니를 견디는 왕고래집 할머니, 고래잡이로 바다란 바다를 다 누비다가 고래잡이가 금지되어 산에 나무를 심으며 살아가는 장포수 할아버지, 화라도 낼 수 있는 가족이 있고 언제 어디서나 당당한 친구 나무(나무 관세음보살 할 때의 나무)가 그들이다.
“니은아, 니가 시원하게 못 울어서 몸이 아픈 거다. 슬픔이 몸 안에서 돌아다니면서 몸을 두드리는 거지.”
부모님의 고향에서 듣는 말 중 가장 크게 니은의 가슴을 치는 말이다. 니은은 이제 사람들의 슬픔을 관찰한다. 다른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슬픔을 감추고 사는지 그리고 슬픔을 견디는 저마다의 방법이 무엇인지.
더 이상 고래잡이를 할 수 없는 할아버지는 산에 나무를 심으면서 상실의 슬픔을 다스리고 있고, 할머니는 패악질을 해대는 딸에게 진심 어린 마음을 담은 편지를 쓰려고 한글을 배우며 슬픔을 견디고 있고, 친구인 나무도 ‘크고 빛나는 액세서리’ 같은 활달함으로 가족간 불화로 얻은 슬픔을 가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니은은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저마다의 슬픔을 지니고 있고 저마다의 방식으로 슬픔을 체화시키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드디어 니은은 가슴 저 밑에서 불끈 솟아오르는 뜨거운 어떤 것을 잡고 결심을 한다.
‘몸 속을 떠돌던 격랑이 끝없이 몸 밖으로 밀려나갔다. 울면서, 나는 이제 어른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다. 할머니는 열다섯에 시집을 갔고, 할아버지는 열여섯에 고래배를 탔다. 나는 열일곱살이다. 법적으로는 미성년이지만 나이로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니은이 장포수 할아버지에게 묻는다. “기억하는 일은 왜 중요해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한다. “그것을 잘 떠나보내기 위해서지. 잘 떠나보낸 뒤 마음 속에 살게 하기 위해서다.”
세상의 모든 상실에 대해, 상실 후 아무 것도 못할 것 같은 이에게 작가가 던지는 전언이다.
‘꽃피는 고래’라는 소설 제목은 고래가 작살을 맞고 죽지 않으면 몇 시간 동안 고래를 끌고 다닌 후 지친 고래의 급소에 작살을 꽂은 후 나오는 숨 속의 핏물을 형상화한 것이다. 죽는 순간에 가장 강렬하게 생명력을 전달하는 고래는 신화의 모습을 하고 있다.
죽음을 포함한 모든 상실에서 어떻게 생의 의지를 스스로 발견해내야 하는지 작가는 소설 곳곳에 보물찾기 놀이의 보물처럼 숨겨놓고 있다.
본명이 김정숙인 김형경 작가(시 쓰는 대학선배 아내의 이름과 같다고 개명)는 1억원 고료 소설 당선, 그리고 욘사마로 불렸던 배용준이 출연한 영화 ‘외출’의 원작자로 한 때 화제를 뿌린 바 있다.
그 후 소설보다는 ‘사람 풍경’, ‘천개의 공감’, ‘만가지 행동’ 등 심리분석서를 계속 출간했다. 이제 사람의 내면 풍경을 그녀보다 더 세밀하게 그려낼 작가는 없을 것 같다. 그녀의 신작 소설을 목 빼고 기다리는 이유다.